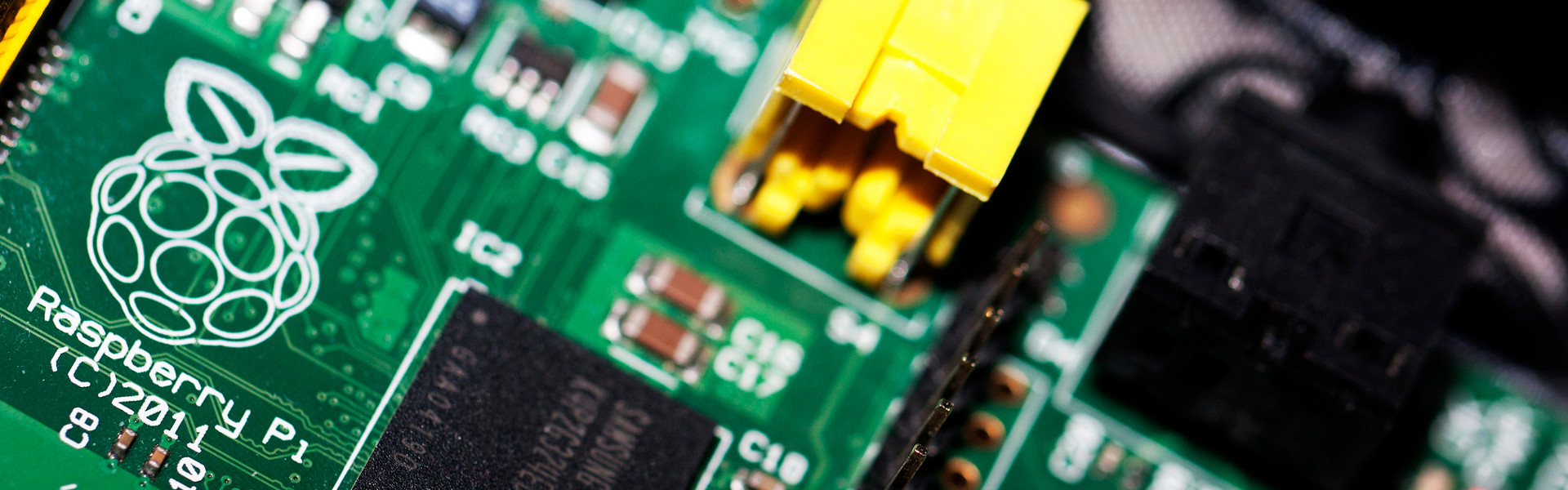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로 예전부터 1년반쯤 전까지는 QualNet을 써 오다가, 작년부터는 줄곧 ns-3만 쓰고 있는데, 둘 사이에 장단점을 간단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.
주의사항: 주관적인 관점이라서 다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음.
<비용>
*QualNet
- 대학교에서 University license로 기본 라이브러리만 구매하면 약 1000만원
- 기본 제공이 안되는 라이브러리 추가 시 약 100~250만원 정도 예상 (LTE, Zigbee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 ㅜㅜ)
- 한 번 라이선스 구입하면 무제한 사용
- 대신 버전 업그레이드 기간에는 제한이 있음.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최신 버전을 써야 할 필요가 생긴다는 것. 2010년쯤에 구입했던 5.1 버전에는 기본 제공하는 와이파이 표준이 802.11a/b/g 밖에 없어서 802.11n이나 ac를 테스트할 수가 없었다. 구 버전 사용자가 최신 버전을 쓰려면 본사에 1000달러를 내면 된다고 한다.
- 멀티코어를 잘 지원해서 시뮬레이션 성능을 높일 수는 있는데, 라이선스 하나에 코어 2개가 최대임. 코어 수 늘리려면 라이선스 더 사야 함(...)
*ns-3
- 무료 (오픈소스)
- 버전 업그레이드 되면 그냥 새로 다운받아서 쓰면 됨
- 오픈소스라서 실시간으로 수정되는 코드를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바로 받아쓸 수도 있다. (물론 그만큼 버그에는 취약. 공식 릴리즈 공지되는 버전만 써도 무방)
<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(GUI)>
*QualNet
- ns-3에 비해 월등히 좋음.
- 마우스 클릭만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실행이 가능한 수준 ㄷㄷ.
-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배치하고 선 긋듯이 노드들 배치하고, 트래픽은 보내는 곳과 받는 곳 사이에 선을 drag & drop으로 죽 그어 주면 만들어짐. 그 선을 더블클릭해서 패킷 사이즈, 보내는 양, 시작시간 등등 다 설정하면 됨. 각 노드도 더블클릭해서 각각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, 프로토콜, IP주소, 그외 각종 설정들 다 바꿀 수 있음.
- 그림 그리기(?)를 끝내고 시뮬레이션 시작(play 버튼)을 누르면 노드와 노드 사이에 패킷 전달되는 과정, 노드의 움직임, 무선일 경우에는 전송 범위까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시간에 맞춰서 다 표시됨. 보여주는 정보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고, 재생되는 속도도 조정 가능. (물론 최고속도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에 비례함)
- 시뮬레이션 끝나면 결과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, L1/L2/L3/L4/어플리케이션 계층 각각에 대해서 통계치를 다 볼 수 있음. 예를 들어 PHY 계층에서 signal 발생시킨 수와 에러율 확인, MAC 계층에서 프레임 전송 수와 실패 재전송 수, 라우팅 계층의 경로 탐색 시도 수, 응용 계층에서의 실제 throughput 이 모든 것을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확인 가능.
- 물론 GUI만으로 논문 실험에 쓸 만한 자기만의 방법을 설정해줄 수는 없고,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코드 수정을 해야 함.
*ns-3
- GUI가 큰 의미가 없음 (...)
- 애초에 ns-3에는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를 설정하는 GUI가 존재하지 않음.
- C++ 코드로 일단 뭐가 됐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뒤에야 자신이 만든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GUI에서 확인 가능. 왜냐하면 ns-3에서 제공하는 NetAnim 이라는 GUI는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고, 시뮬레이션 결과 파일을 읽어들여서 재생하는 역할이기 때문. (스타크래프트의 지난 경기 리플레이로 보는 것과 차이가 없음)
- 앞으로도 눈으로 보는 대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GUI가 나올 확률은 낮음. ㅜㅜ 왜냐하면 퀄넷은 시뮬레이션 환경 자체는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로 처리하고, 실제 L1/L2/L3/L4 계층의 행동은 C/C++ 코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GUI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, ns-3는 그냥 모두 다 C++로 코딩해야 되기 때문에.
- 그나마 ns-3 입장에서 위안이 되는 점은, 토폴로지를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고 환경을 조금씩 바꾸면서 수많은 반복 실험을 해야할 때가 되면 GUI를 쓸 필요 없이 커맨드 라인에서 배치(batch)를 돌리게 되니까 퀄넷이나 ns-3나 별 차이가 없게 될 것이라는 점. (퍽이나 ㅠㅠ)
<시뮬레이션 성능(scalability, running time 측면)>
*QualNet
- 애초에 퀄넷이 처음부터 내세우는 장점이 scalability이고, 기본적으로 모든 코드에 MPI 적용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(사용자가 새로 만드는 코드까지 전부) 멀티 프로세서 지원의 편의 측면에서 ns-3를 압도함.
- QualNet 판매하는 회사 이름도 심지어 Scalable Networks임 (...)
- GUI에서는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 옆에 프로세서 개수 칸이 있는데 그냥 숫자 써주면 끝.
- 커맨드 라인에서는 "-mp 2"라고 쓰면 알아서 듀얼코어 써서 돌림.
- 그냥 싱글코어로 돌려도 꽤 빠른 편임.
- 다만 GUI에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진행 중인 애니메이션 화면을 봐 가면서 실행하면 당연히 느림. (...) GUI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면 커맨드 라인에서 돌려야 함.
-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, 코어 개수도 현질을 해야 3개 이상 쓸 수 있다는 점.
- 또한 라이선스 때문에 한번에 여러 머신에서 여러 프로세스를 돌리는 것이 불가능함. (라이선스 서버 1개가 라이선스 1개를 프로세스 1개에 할당하는 방식이고, 그 동안에는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없는 구조 ㅠㅠ 동시에 여러 머신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머신 개수만큼 라이선스가 있어야 함.)
*ns-3
- ns-3도 퀄넷처럼 이벤트 기반 처리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, MPI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멀티코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,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퀄넷과 큰 차이가 없음. 하지만 사용의 편의가 떨어지는 게 문제.
- ns-3에서 멀티코어를 쓰려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mpi 관련 라이브러리를 미리 설치해야 하고, 자신의 시뮬레이션 코드에 MPI를 쓰겠다는 설정을 또 별도로 작성해 줘야 함. 단순히 argument에 숫자 추가만 하면 되는 QualNet에 비해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음. (인터넷에도 MPI 적용이 안돼서 질문하는 글이 많음)
- 모든 코드가 다 MPI가 되는 것도 아님. 특히 와이파이 같은 무선 쪽은 MPI가 아직 안돼서 무조건 싱글코어로 돌려야 함. 이게 특히 심각해지는 부분이 ns-3가 가상 머신들을 연동해서 돌아갈 때.
- 다만 ns-3가 퀄넷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 있기는 한데, 똑같은 시뮬레이션 인스턴스를 1개가 아니라 조건이 조금씩 다른 수백~수천 개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. 퀄넷은 라이선스 1개당 1개 프로세스만 존재할 수 있지만, ns-3는 오픈소스니까 그런 거 없다. 원하는 만큼 클러스터에 복제해서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음. 즉, 개별 시뮬레이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동시에 여러 머신과 프로세스를 써서 얼마든지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을 줄일 수 있음.
<외부 프로그램과의 확장성>
*QualNet
- 외부 프로그램에서 패킷을 만들어서 퀄넷의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데, 방법이 편하지 않음. 외부 프로그램과 퀄넷 사이에 패킷을 서로 전달해 주는 코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함. (이것도 C언어로)
*ns-3
- 리눅스 컨테이너(lxc)를 써서 VM을 만들어서 그 VM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ns-3가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!!
- ns-3 시뮬레이션 코드 위에 아예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그대로 컴파일해서 돌리는 것(Direct Code Execution; DCE)도 가능!!
- 그러나 위 2개 다 아직 한계가 있음 ㅠㅠ
- VM 방식은 호스트 머신(리눅스)에 브릿지 인터페이스에 tap을 붙여서 ns-3와 연결되는데, 여기서 약간씩 딜레이가 발생함. VM들은 자기들만의 clock을 갖고 있는데 ns-3에 약간이나마 늦게 패킷이 흘러들어오면 그걸 ns-3 프로세스가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하고 다시 VM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각 VM은 이미 자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. 결국 실제 환경에 비해서 delay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.
- 게다가 설상가상으로, 와이파이 같은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 저렇게 VM을 붙이면 ns-3가 아직(2017.04.15 기준) 무선 환경을 멀티코어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선 환경의 신호 세기, 간섭, fading, propagation 이런 것들을 다 싱글코어에서 계산해야 됨(......)
- 그래서 VM 10개를 만들고 와이파이 애드혹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했더니, 각자 1초에 하나씩 hello 메세지를 broadcast하기만 하는데도 그 상태로 ping을 날리면 20초가 넘어가는(...) 도저히 실험 불가능한 상태가 됨. 지못미 ㅠㅠ
- VM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DCE인데, 이것도 사실 C++로 개발된 프로그램만 취급함. C++ 소스코드를 가져와서 ns-3에서 호환될 수 있게 g++ 옵션을 조금 추가해서 빌드하면 되는데, 그렇다고 모든 시중의 C++ 프로그램이 다 빌드되는 것도 아님. ns-3 커뮤니티 얘네들은 자랑스럽게 iperf를 소스코드 수정 없이 그대로 빌드해서 갖다쓸 수 있다고 자랑하는데, tcpdump 같이 더 심각한 일을 하는 소스코드는 아예 컴파일 불가능 ㅜㅜ
- 내가 직접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C++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리려고 해도 생각보다 지원 안되는 코드가 많아서 코딩에도 제약이 있음. 이게 뭐야...
- 결론적으로, 분명히 확장성이 좋아 보이는데 결국 실제로 제대로 써 보려고 달려들면 퀄넷이나 ns-3나 안되는 건 마찬가지임 ㅠㅠ
<통계(Statistics)>
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통계를 내 주는 부분은 양쪽 다 방식도 다르고 장단점도 분명해서 어느 한 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.
*QualNet
- 위의 GUI 부분에도 언급되어 있듯이, 물리 계층부터 응용 계층까지 각 계층에서 낼 수 있는 모든 통계를 항상 만들어 줌. GUI에서 그래프를 그려줄 때 참고하는 파일이 .stat 파일이고, 시뮬레이션 1개를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.stat 파일을 직접 파싱해서 원하는 통계치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.
- 모든 계층에 대한 통계가 다 나오는 점이 의외로 디버그에 유용할 때도 있음. 가령 응용 계층에서 패킷을 모두 전송 실패했는데 물리 계층에서 받는 signal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중간의 라우팅 계층 같은 부분에서 기대와 다르게 패킷을 drop했을 수 있으므로, 라우팅 계층의 logic을 살펴보는 식의 접근이 가능함.
*ns-3
-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생성하는 노드 각각에 대해서 .pcap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 (코드에 pcap output을 만들어 달라고 1줄 추가하면 됨), 이 pcap 파일을 Wireshark에서 바로 보거나 그래프를 볼 수도 있고, tcpdump에서 약간의 규칙을 적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포맷으로 만들어 쓸 수 있음.
- pcap 파일을 기반으로 패킷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는 부분은 오픈소스 도구들도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퀄넷의 자체 포맷(stat)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음.